이별은 슬픈 것입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낭군이 떠날 때 오죽하겠습니까? 아낙은 아픔을 안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발병이 나도록’ 저주한 것이 아니라, ‘발병이 나지 않도록’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옛 조선의 아낙들에겐 낭군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아픔이 많았습니다. 남자들의 외도도 있었지만, 가난했던 시절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머슴으로, 품팔이로, 소금장수로, 행상 장사치로, 또는 의적으로 많이 떠났습니다. 그녀들은 그 아픔을 노래로 승화시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은 중국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헐버트 목사님은 영문 월간지 ‘한국소식’ 1896년 2월호에 아리랑을 소개하며, ‘아리랑은 한국인에게 쌀과 같은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11년 조선족 아리랑을 중국의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 하고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cf. 김홍진, [독자생각] ‘아리랑’의 뜻을 아시나요).
한국에는 수 많은 ‘아리랑 고개’가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배고픔도, 일정 시대의 압정도, 공산치하에서의 학정도, 6.25 전쟁의 비참도, 모두 우리 민족에겐 아리랑 높은 고개였습니다. 그 수 많은 아리랑 고개를 눈물로 넘으며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우리는 아리랑 고개를 또 넘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사 분명 넘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리랑을 부를 것입니다. 아리랑은 단연코 우리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OwdWF6lGfQ
아리랑은 우리의 노래이면서 세계의 노래입니다. 독일 바드 크로이츠나하에 있을 때는 미군 가족들과 함께, 네덜란드에서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함께 아리랑 노래 부르며 춤도 추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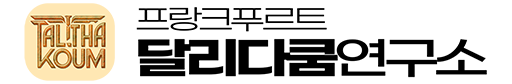
Leave a Reply